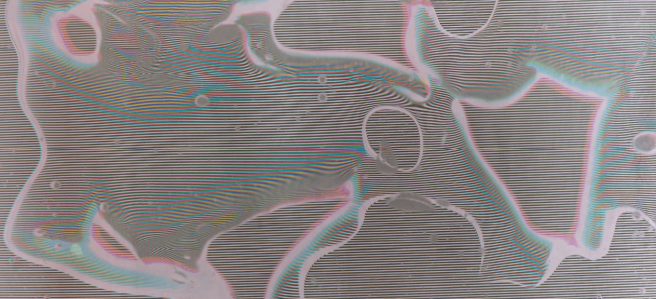
| 기간| | 2024.08.29 - 2024.10.09 |
|---|---|
| 시간| | 10:00 - 18:00 |
| 장소| | OCI 미술관/서울 |
| 주소|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4 |
| 휴관| | 일, 월 |
| 관람료| | 무료 |
| 전화번호| | 02-734-0440 |
| 사이트|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작가| |
오연진
|
정보수정요청



|
|
전시정보
움직이는 필름, 움직이는 시각, 움직이는 매체 오연진의 작업을 훑어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리처드 세라의 초기 작업이었다. 그간 오연진의 작업이 주로 사진성과 관련해 논의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나의 이런 연상은 상당히 의외거나 엉뚱하게 보일 테다. 오연진과 세라를 겹쳐보게 만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눈에 띈 부분은 과정이 곧 결과가 되는 강한 수행성이다. 녹인 납을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에 던져 굳은 모양을 그대로 떼어낸 세라의 ≪Splash Piece: Casting≫(1969)처럼, 현상액을 뿌리고 노광을 주는 과정이 고스란히 이미지에 남은 오연진의 ≪Pastry≫(2022)나 ≪Tweed≫(2022) 연작은 중첩을 함유한 제목 그대로 반복된 수행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표로 간직한다. 비단 이 작업 외에도 오연진의 모든 작업은 노광과 현상, 인화라는 암실의 프로세스를 노동집약적으로 변주해 제작 공정을 투명하게 드러내기에, 과정(process)이 결과물 속에 압축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결과물이 물리적으로 변화하지 않더라도 오연진의 작업을 프로세스 아트로 읽을 수 있으며, 사진의 지표성이 대상이 아니라 과정에 적용된 독특한 사진 작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료의 속성과 이미지의 구성 원리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지점 또한 세라와 친연성이 있다. 철판을 계속 쌓다가 수직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적층을 멈추는 세라의 ≪Stacked Steel Slabs≫(1969)는 조각의 구성이 끝나는 지점이 무게 중심이라는 조각의 내부에서 결정된다. 철판의 무게와 모양이 작업의 구조를 결정하듯, 오연진의 ≪Solar Breath≫(2019)는 이미지가 인쇄된 반투명한 시폰 천 위에 아크릴 물감을 얼마나 칠하느냐에 따라 투광도가 달라져 결과물의 색과 밝기가 좌우된다. 필름 역할을 하는 물질의 속성, 초점 거리, 노광 시간, 조리개의 열린 정도, 현상액이 묻는 시간 등 이미지를 생산하는 재료 및 장치의 광화학적 속성이 그대로 이미지의 색과 형상에 반영되는 정직함은 납판을 말고 접고 떨어뜨리는 행위를 직설적으로 수행하는 세라의 작업과 묘하게 연결된다. 마지막 이유는 출발 매체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전통적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경계를 실험하는 태도의 유사성이다. 세라는 ≪Hand Catching Lead≫(1968)를 비롯해 여러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이는 조각의 공간성에 시간성을 부가해 새로운 시공간 연속체에서 조각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오연진 역시 사진과 회화, 사진과 영상의 경계에서 늘 진동해왔다. 사진에서 회화로, 다시 사진으로 자리바꿈을 계속하는 ≪Solar Breath≫는 사진을 본떠 그리거나,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다시 찍는 등 평면 매체 사이를 넘나들며 회화(painting)가 아닌 그림(picture)을 실험하는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떠올리게 한다. ≪Anorthoscope≫(2020)는 필름이 움직이고, 피사체가 움직이며, 카메라가 움직이는 마야 데런의 영화 ≪The Very Eye of Night≫(1958)에서 영감을 얻어 끝없이 변화하는 이미지의 움직임을 반복적 시퀀스와 제3의 이미지 생산으로 구현했다. 2024년 OCI미술관 개인전 《이것은 의견이 아니다. 아니, 의견인가?》의 출품작 역시 전술한 속성에서 예외가 아니다. 아크릴 위에 홀로그램 필름을 얹고 그 위에 구겨진 비닐을 올린 후 비닐 모양대로 레진을 부어 굳힌 ≪Self-referential Film (Molted)≫(2024) 연작은 작가가 비닐을 구긴 정도가 그대로 동결된 수행성을 지닌다. 조각에 가까울 정도로 튀어나온 작업의 두께는 평면과 입체의 경계에서 애매하게 흔들리며 사진 매체의 외연을 넓힌다. 한편 투명한 슬라임 위에 줄무늬 패턴의 필름을 얹고 두세 번 중복 노광을 통해 추상적 형상을 얻은 ≪Lean≫(2024) 연작 또한 재료의 물성이 이미지와 직결되며 매체의 경계를 흔든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슬라임의 불균질한 표면과 출렁이는 물성은 줄무늬 패턴을 통과하는 빛에 무아레(moire) 현상을 유발하고, 이는 크로모제닉 프린트에 회화적 변주를 부여한다. 여기서 외견상 부조에 가까운 ≪Self-referential Film (Molted)≫에 굳이 ‘사진’이라는 호명을 한데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내 작업을 사진으로 인지하면서도 사진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러한 태도가 다시 사진적인 것으로 독해되기를 바란다”는 (오연진 작가노트, 「사진, 매체, 조건, 클리셰」, 2018.)2018년의 작가 노트가 매체 간 혼성과 확장을 지향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신작은 움직이는 필름(film in motion)에 대한 근자의 탐구의 연장이다. 여기서 움직이는 필름은 일반적인 영상(moving image)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연진의 움직임(moving)은 필름의 물리적 운동이 아니라 비고정성을 뜻한다. 카메라를 통한 사진에서 네거티브 필름은 항상 고정된 상을 전제로 했다. 비록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원론적으로 네거티브는 이미 고정된 것이었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오연진의 작업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필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흐르는 현상액 자체가 필름이 되기도 하고(≪Pastry≫), 밀착 인화를 통해 대상을 필름으로 만들기도 한다(≪Contact≫(2017)). 2020년 이후 작가는 액체로서의 필름에 주목했다. 신작의 토대가 되는 ≪Lamella≫(2020), ≪Object-Through≫(2020~), ≪Self-referential Film≫(2020~)은 모두 2020년에 시작되었다. ≪Lamella≫는 금속 프레임에 비누막을 입히고 빛을 투과해 찰나적으로 산란하는 액체로서의 필름(비누막)을 찍은 카메라 사진이고, ≪Object-Through≫는 인화지 위에 투명판을 얹어 물을 떨어뜨리거나 확대기 안에 아크릴로 작은 수조를 만들고 그 위에 슬라임을 올려 액체 혹은 겔을 필름으로 삼은 카메라 없는 사진이다. ≪Lean≫은 배경 이미지가 없는 흑백 사진인 ≪Object-Through≫에 줄무늬 패턴을 가미하고 여러 색깔의 빛으로 중첩 노광해 색감을 부여했다. 고정되지 않고 출렁이는 이 유동체 필름은 이중성을 지닌다. 이들은 빛을 투과해 피사체(줄무늬 패턴)를 보여주는 동시에 스스로 보이는 대상이 된다. 자신을 투과시켜 피사체를 보여주는(looking through) 투명한 창으로서의 필름과 스스로 피사체가 되어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looking at) 사물로서의 필름은 이렇게 만난다. (오연진 작가노트, 「물, 리퀴드, 비눗방울」, 2020) 한편, ≪Self-referential Film≫ 연작은 신작 ≪Self-referential Film (Molted)≫의 직접적 선례다. 기본 원리는 흡사하다. ≪Self-referential Film≫이 캔버스 위에 PVC 필름을 입히고 레진을 뿌리거나 바르는 방식이었다면, ≪Self-referential Film (Molted)≫은 홀로그램 PVC 필름 위에 구겨진 비닐이 한 겹 추가되고 그 모양을 레진으로 고정하는 구조다. 이런 제작 방식의 차이로 전작은 레진이 부분적으로 녹아내리거나 흐르는 표면을 지니고 있어 ‘용융(Melting)’이라는 부제가 붙은 경우가 많고, 신작은 각진 비닐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 있어 갑각류의 껍질을 연상시키기에 ‘탈피(Molted)’라는 부제가 붙었다. ≪Self-referential Film≫의 개념 또한 필름에 대한 자의식적 탐색이다. 일반적 사진에서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필름은 전면화해 이미지 앞에 선다. ‘자기 참조적’이라는 제목은 구조물로서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는 자의식적 필름을 가리킨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을 띠는 움직이는 시각과 겔 상태로 흔들리는 움직이는 필름은 사진의 고정관념에 대한 작가의 문제 제기이자 답변이다. 네거티브(필름)가 움직인다면, 네거티브가 전면에 등장한다면, 그런 사진은 무엇일까? 오연진은 필름이 사물이 되고 흐르는 제3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때의 움직이는 시각(vision in motion)은 라즐로 모홀리나기와 달리 물리적인 운동을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오연진이 생각하는 움직임은 조건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연진 작가노트, 「가능성으로서의 무빙」, 2020.) 이는 반복이 동일성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생산하는 변화의 상태를 뜻한다. 필름의 매질, 노광 시간과 횟수, 빛의 강도, 현상액의 투여량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오연진의 카메라 없는 사진은 모든 판본이 원본이지만 동시에 하나가 아닌 여럿이어야만 의미가 있다. 조건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변주들은 반복을 통해서만 발생하고, 복수여야 변화 가능성이 드러난다. 오연진의 모든 작업이 연작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건이 움직이는 세계는 “수천 개의 평행 우주처럼 동어반복적인 동시에 조금씩 차이를 만들어 내며 어긋나” (오연진 작가노트, 「사진, 매체, 조건, 클리셰」, 2018.)있는 새로운 사진적 시공간이다. 이런 세계는 베르그손의 세계와도 같다. 베르그손에게 세계는 연속하는 운동 자체이고, 이 운동이 특정한 순간성으로 응고되는 것이 이미지다. 우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공간 연속체이고, 인간이 이 연속적 파동을 순간적으로 지각할 때 이미지가 발생한다. (앙리 베르그손(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pp. 314-349.) 스케일, 노광시간, 초점 거리 등의 암실 조건을 순간순간 지정해 우연과 의도가 뒤엉켜 도출되는 오연진의 이미지는 생산될 수 있는 가능한 수많은 잠재태들이 특정한 순간을 만나 현실화된 고유한(unique) 결과다. 그 각각의 이미지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온습도, 특정한 작가의 상태, 특정한 물질이 맺는 관계로 조성된 독특한(singular) 개체다. 오연진의 작업에서 개별 이미지와 연작의 관계, 각 연작과 작업 전체의 관계, 하나의 매체와 다른 매체 사이의 관계는 베르그손적 이미지와 운동의 관계에 조응한다. 움직임의 연속 스펙트럼 속에서 각 조건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결과값이 바로 오연진의 이미지다. 그것은 항시적인 운동 속에 있는 일시적 정지 이미지다. 그 속에서는 필름도, 이미지도, 조건도, 매체도 늘 움직인다. 문혜진(미술비평가) (출처 = oci갤러리)
